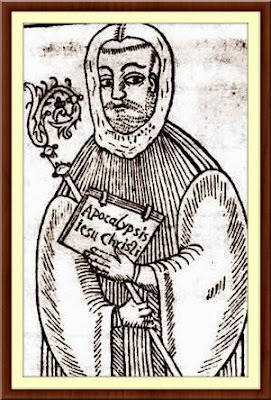(앞에서 계속됩니다.) 18. 조아키노가 파악한 성령의 본질 (2): “위로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령이 수행하는 고유한 임무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피의 보복자γοηλ”를 지칭합니다. 그분은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복수하는 소송인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세상에서 정의로움을 위하여 부정과 죄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원고”로서의 성령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령은 판관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최후의 심판, 다시 말해 마지막의 재판을 통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들의 넋을 기릴 뿐 아니라, 죄악에 대한 진범을 가려내어, 그에게 정당한 죗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