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계속됩니다.)
28. 푸아니의 시대 비판 (3): 푸아니는 유럽 사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유럽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계몽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아니에 의하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통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를 차지하고 싶은 끝없는 탐욕은 인간의 부류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분할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피비린내 나게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인의 삶은 푸아니의 견해에 의하면 “괴로움과 궁핍함의 사슬une chaine des souffrances et des mesères”로 축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Foigny 1676: 99). 이와 관련하여 푸아니는 유럽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상류층의 지배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수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는 가정 내에서도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가부장은 자신에게 속한 식솔들을 억압하고 부자유의 질곡에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바로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종교 그리고 교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질서에 의해서 합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 완벽한 유토피아 공동체는 존재하는가?: 공동체는 절대적 이성의 이름으로 모든 도덕을 규정하고, 사회적 조화로움을 완성시키지만, 전쟁을 치르며 적을 완전히 궤멸시킬 때에도 절대적 이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어의 『유토피아』의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쪽 대륙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국가의 체제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체의 이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면, 무정부주의의 사회는 아무런 마찰 없이 영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푸아니의 지론이었습니다. 만약 한 공동체가 국가의 권력의 힘에 의존하지 않은 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유토피아 공동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든, 일부 엘리트로 영위되는 작은 행정부든 간에, 공동체를 통솔하는 기관이 없다면, 하나의 공동체는 구체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순식간에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선장이 없더라도 조타수 내지 항해사가 없다는 풍랑을 맞이한 배는 암초에 걸려 전복되거나 파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푸아니가 묘사한 오스트레일리아 공동체의 유토피아는 그 자체 완벽한 아나키즘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위의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와 조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 자크가 마지막 대목에서 고초를 겪는 것도 모두 이러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30. 요약. 푸아니의 유토피아의 특성: 푸아니가 서술한 유토피아의 특징은 일곱 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인간의 열정과 욕망은 주어진 관습 도덕 그리고 법으로써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인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2) 인간의 열정과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양성애 그리고 동성애가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푸아니는 과감하게 양성구유의 인간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3) 푸아니가 묘사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문명은 조화로움, 갈등의 부재, 동질성 그리고 평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푸아니의 거대한 공동체는 기하학적 규칙을 도입하여 혼란스러운 자연을 인간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5) 푸아니는 토마스 모어의 국가주의의 모델을 지양하고, 지배 기관으로서의 국가 없는 무정부주의의 거대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6) 푸아니의 유토피아의 공간 속에서는 만인이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자연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로써 인간의 문명은 존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7) 푸아니의 거대한 오스트레일리아 공동체는 개개인에게 충분한 여가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로써 개개인은 물질적 궁핍함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습니다. (Heyer: 412).
31. 작품의 문제점 (1), 양성구유의 인간형: 푸아니가 묘사한 자웅양성의 인간형은 기이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 남성이 여성을, 혹은 여성이 남성을 끝없이 갈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완전하고도 훌륭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극복될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특성과 같습니다. 푸아니는 남쪽 대륙의 사람들에게 자웅양성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성의 갈등으로 인한 제반 사회적 심리적 난제를 처음부터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일 인간이 양성을 지니고 있다면, 인간은 성의 차별로, 혹은 충족될 수 없는 성욕으로 고뇌하지 않으리라는 게 푸아니의 상상이었습니다. 만일 성의 구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성 내지 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개개인들에게 강제적 폭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푸아니가 양성구유의 인간형을 등장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개별 인간들에게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강제적 폭력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결론 말입니다.
32. 작품의 문제점 (2), 군대 조직: 푸아니의 남쪽 대륙은 거대한 무정부주의의 공동체로 이해됩니다. 이곳에서는 결혼제도도 없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왕 내지 국가도 없으며, 사회의 엘리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 조직 역시 수직구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를 총괄하는 군사 편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일직선적으로 상명하달의 시스템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장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어떤 일사 분란한 체계에 의해서 작전 명령을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남쪽 대륙의 사람들은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 어느 누구의 통솔도 받지 않습니다. 거대한 공동체의 군대 조직에는 모순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 군인들이 상부의 어떤 작전 명령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문제는 1억 4천의 인구를 갖추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가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때 어떻게 이합집산의 방식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우리는 푸아니의 군대 조직의 치명적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 문명에 대한 푸아니의 입장: 푸아니는 작품 『미지의 남쪽 대륙』에서 남녀평등에 입각한 아나키즘 유토피아를 탁월하게 설계하였습니다. 푸아니가 묘사한 남쪽 대륙 사람들은 자웅양성으로서 언제나 나체로 생활하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확고한 질서라든가 외부적 규범을 모조리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은 문명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푸아니는 철학자 몽테뉴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몽테뉴는 낯선 지역에서 살아가는 원시인들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근원적 단순성에 입각하여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그는 유럽의 문명과 비유럽의 야만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한 셈입니다. 원시적 인간은 몽테뉴에 의하면 모든 확고한 질서 내지 외부적 강령을 부정하며, 원시적 단순함에 근접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Montaigne: 111). 그렇기에 문제는 몽테뉴에 의하면 원시인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경멸스러운 시각 내지 이들을 착취하려는 유럽인들의 의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푸아니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문명과 야만에 관한 몽테뉴의 이러한 이원론적 구분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남쪽 대륙의 원주민에게는 고유한 지적 능력, 이성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참고 문헌
- Berneri, Marie Luise (1982): Reise durch Utopia, Berlin.
- Foigny, Gabriel de (1676): La Terre Australe connue etc, Vannes.
- Foigny, Gabriel de (1982): Eine neue Entdeckung der Terra Incognita Australis, in: Berneri Marie Louise: Reise nach Utopia. Reader der Utopien, Berlin.
- Girsberger, Hans (1972): Der utopische Sozialismus des 18. Jahrhunderts in Frankfreich, Wiesbaden.
- Heyer, Andreas (2009): Sozialutopien der Neuzeit. Bibliographisches Handbuch. Bd. 2, Bibliographie der Quellen des utopischen Diskurses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Münster.
- Kirchenheim. Arthur von (1892): Schlaraffia politica. Geschichte der Dichtungen vom besten Staat, Leipzig.
- Kleinwächter, Friedrich (1891): Die Staatsromane. Ein Beitrag zur Lehre des Communismus und Socialismus, Wien.
- Mohl, Robert von (1855): Geschichte und Literatur der Staatswissenschaften, 1. Bd. Teil III, Erlangen.
- Montaigne, Michel de (1998): Essais, Frankfurt a. M., S. 109 – 115.
- Saage, Richard (2002): Utopische Profile Bd. II. Aufklärung und Absolutismus, Münster, S. 35 – 52.
- Schölderle, Thomas (2012): Geschichte der Utopie, Wien/Köln/Weimar.
- Voigt, Andreas (1906): Die sozialen Utopie. Fünf Vorträge, Leipz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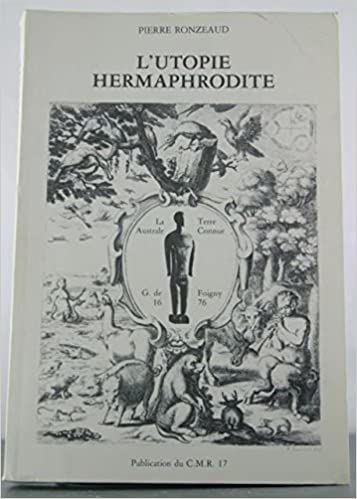
'32 근대불문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로박: 발자크의 '창녀의 영광과 몰락' (2) (0) | 2018.08.19 |
|---|---|
| 서로박: 발자크의 '창녀의 영광과 몰락' (1) (0) | 2018.08.19 |
| 서로박: (5) 푸아니의 양성구유의 유토피아 (0) | 2018.02.20 |
| 서로박: (4) 푸아니의 양성구유의 유토피아 (0) | 2018.02.20 |
| 서로박: (3) 푸아니의 양성구유의 유토피아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