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권 사회의 발견: 요한 야콥 바흐오펜 (1815 - 1887)의 "모권 Das Materiarchat"은 철학 내지는 종교의 역사를 천착한 문헌으로서 186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바흐오펜은 고대 그리스 이전의 선사 시대 및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로마 역사 연구가, 테오도르 몸젠 (Th. Mommsen)의 이른바 직관적인 것을 중시하는 문헌학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몸젠에 의하면 가부장적 수직 구조의 연속 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흐오펜은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가부장 주의의 사회 구조 이전에 이미 모권 사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나중에 이어지는 역사적 발전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부권이라는 사회적 구도로부터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Jens: 33).
이러한 주장은 나중에 인류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에 의해 반박당합니다. 모건은 『고대 사회Ancient Society』 (1877)에서 군혼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혼인 형태라는 바흐오펜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군혼이 고대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대에도 일부 통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령 하와이의 투날루안 부족은 집단 성교의 관습을 계속 이어왔다고 합니다.
2. 요한 야콥 바흐오펜의 해적이: 바흐오펜은 1815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괴팅겐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과 역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은사 가운데에는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사비니 그리고 카를 페르디난트 랑케 등이 있습니다. 바흐오펜은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약 2년 동안 런던, 파리 그리고 케임브리지 등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841년에 바젤의 법학부에서 교수가 되어 로마법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그는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여행했는데, 도시 로마는 그의 마음에 커다란 영감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바흐오펜의 교수직은 약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젤의 지방 신문은 그의 교수 채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흐오펜이 교수가 된 것은 집안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흐오펜은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거론되는 게 너무 싫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1844년부터 거의 25년 동안 바젤 지방법원의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865년에 그는 자신보다 25세 나이 어린 귀족 가문의 처녀, 루이제 부르크하르트와 결혼했습니다. 바흐오펜은 자신의 모든 책을 독학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밖에 바흐오펜은 골동품 수집가로 당대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887년 바흐오펜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모든 문헌 그라고 골동품을 바젤의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3. 바흐오펜은 역사적 팩트보다 종교 그리고 신화를 더욱 중시한다. 바흐오펜은 모권의 시대가 부권의 시대로 교체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흐오펜은 모든 논의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끌어들입니다. 가령 모권의 원칙이 부권의 원칙으로 이행된 과정은 오로지 신화를 통해 해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아이스킬로스는 「복수의 여신 Eumeniden」에서 아폴론은 여신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디오니소스가 가부장 중심주의를 오로지 모권주의를 위해 파기시켰다면, 아폴론은 여성과의 모든 힘의 결합을 차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흐오펜은 종교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모든 문명을 움직이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지렛대”라고 합니다. (Mutterrecht: 19). 여기서 우리는 바흐오펜의 논의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사변적 상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 신이 여성 신을 무찌르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한 이야기는 동서양의 다른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백인 남성의 폭력과 횡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를 자주 거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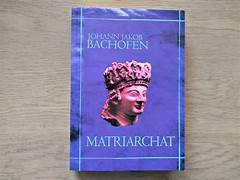
4. 가부장 중심주의 비판과 모권에 대한 동경: 원시 사회에는 처음에는 난혼Hetärismus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한 무리의 여자들이 짝짓기하는, 이른바 군혼(群婚)의 형태로 출현했습니다. 뒤이어 모성 중심적인 모계 사회가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꿀벌의 세계에서 여왕벌이 “모든 종족의 어머니”로 군림하듯이 (Mutterrecht: 85), 여성은 하나의 씨족을 거느리는 원초적 여성이며, 대모(大母)라고 했습니다. (한미희: 192f). 세 번째로 나타난 체제가 아폴론이 관장하는 가부장 중심의 부권사회였습니다. 바흐오펜은 이른바 중간 단계의 모권 사회를 상정하여, 서술해 나갑니다. 뒤이어 나타난 부권의 원칙은 바흐오펜에 의하면 종국에 이르러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서 국가적 이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바흐오펜은 모권주의가 부권주의로 변화한 역사적 과정에 관해서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흐오펜에 비하면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자신의 책, 『가정, 국가 그리고 사유권의 기원』에서 모권이 부권으로 교체된 시점은 기원전 3000년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경 시대에 사람들은 수렵과 채취의 생활을 접고 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는데, 이때 사유권이 확립되었으며, 가부장적 부권 사회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엥겔스에 의하면 사유권이 확립되고 가부장적 가정의 형태 그리고 소규모의 국가가 형성될 때 모권 사회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엥겔스는 모권이 가부장적 권한으로 대치된 사건을 인류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고 규정합니다.
5. 여성 지배는 남성의 폭력적 지배와는 약간 다르다, 바흐오펜은 모권을 논하면서 “여성 지배 Gynaikokratie”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모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성 지배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을 무력으로 지배했다고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모권 Materiarchat”이라는 단어보다는 “여성 우월주의 Maternalismus”이라는 용어를 선호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여성 중심적 사회는 폭력과 억압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남성과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는 일은 전개되지 않았으며, 남성들 역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주장한 학자 가운데에는 사회학자 볼프강 아벤트로트Wolfgang Abendroth도 있습니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여성의 지배 체제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 유효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블로흐: 187).
6. 모권 사회의 세 가지 특성: 여성 우월주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째로 자식 가운데 아들보다는 딸이 세습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대가족 체제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에 있어서 여성이 칼자루를 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일처제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범죄 가운데 어머니 살해는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합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땅의 여신 데메터를 숭배해야 합니다. 이는 바흐오펜에 의하면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이아 그리고 데메터 여신은 물과 흙의 여신으로서 만물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결실의 신이라고 알려진 케레스 역시 데메터의 규칙을 따릅니다. 바흐오펜은 데메터 여신이 관장하는 물(水)을 깊고도 넓은 나일강을 떠올렸습니다. (박설호: 247). 흐르는 물은 끝없는 생명력을 구가하면서 자식을 잉태하는 자유 여성의 성적 욕망에 비유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여성은 몸을 파는 여성, 혹은 자유로운 성을 찬양하고 성을 실천하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7. 고대 아르카디아의 이상으로서의 여성성: 바흐오펜은 이러한 견해에 바탕을 두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즉 “모권은 결코 어떤 특정한 종족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초창기의 문화적 단계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창기란 태고의 시대 내지는 고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흐오펜의 사고가 신화적이며 고대적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바흐오펜은 모든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고대 아르카디아의 이상으로 상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권 세계의 구조적 요소로서 그는 낮보다는 밤을 중시하는 원칙을 지적합니다. 가령 “달은 해보다 중요하고, 결실을 안겨주는 대양보다도 대지가 더 중요하다. 자연적 삶의 어두운 죽음의 세계를 변화를 촉진하는 밝은 세계보다 우위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중심적인 종교가 행해지는데, 이는 모든 삶에 모권적 법칙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남성적 원칙은 추상적, 합리적, 정신적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모권 법칙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대지, 물질, 어머니, 지구 그리고 달을 관장한다면, 남성은 하늘, 비물질, 아버지, 상부 그리고 태양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8. 결혼에 대한 바흐오펜의 비판적 견해: 바흐오펜은 부권주의의 도래와 함께 오늘날의 일부일처제의 관습이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혼은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관습화된 것인데, 원래는 모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적 계명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데메터 여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일부일처제 결혼식은 바흐오펜에 의하면 그 자체 여신에게 사죄하는 의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면 한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은 데메터 여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는 어느 개별적 남성의 품속에서 시들어버릴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매력을 자연스럽게 가꾸”며, 나아가 여러 명의 남편에게 사랑의 즐거움을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권 세계의 생활 방식은 바흐오펜에 의하면 오늘날 기생, 혹은 매춘 여성들에 의해서 남아 있는데, 가부장주의가 뿌리를 내린 이래로 더 이상 고수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9. 신화란 상징의 해석이다. 사실 여성 지배는 인간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흐오펜은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추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를 하나의 사실로 서술했습니다. (블로흐: 186). 물론 바흐오펜은 모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연대기와 구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오펜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화 그리고 낭만주의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알프레트 보이믈러Alfred Bäumler는 『낭만주의 신화학자 바흐오펜Bachofen der Mythloge der Romantik』 (1912)에서 바흐오펜의 사고 속에 담긴 낭만주의의 신화학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유럽 학계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컨대 낭만주의 철학자 셸링 Schelling의 “밤의 철학”은 모권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동경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즉 바흐오펜은 누구보다도 먼저 신화학, 인류학 그리고 종교학에서 요구되던 고대 사회의 모권의 특성을 거론했다는 사항 말입니다. 그렇기에 레오폴트 치글러 Leopold Ziegler는 “신화란 상징의 해석이다.”라는 바흐오펜의 문장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미래 철학의 중요한 관점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문헌
- 바흐오펜, 요한 야콥: 모권. 고대 여성 지배의 종교적 법적 성격 연구, 2권, 한미희 역, 나남 2013.
- 박설호: 흙의 시학, 혹은 토본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in: 창작21, 통권 61호, 2020, 244 – 273.
- 블로흐, 에른스트: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열린책들 2011.
- 한미희: 바흐오펜의 『모권』에 나타난 여성 지배의 본질과 역사 연구, in: 독일언어문학, 제 52집, 2011, 183 – 201.
- Bachofen: Das Mutterrecht. Eine Untersuchung über die Gynaikokratie der alten Welt nach ihrer religiösen und rechtlichen Natur, Stuttgart 1861.
- Bachofen: Römische Grablampen nebst einigen anderen Grabdenkmälern vorzugsweise eigener Sammlung. Basel 1890.
- Fromm, Erich. „Die Theorie des Mutterrechts und ihre Relevanz für die Sozialpsychologie“. In Fromm, Erich, Die Krise der Psychoanalyse , S. 106–134. London. Jonathan Cape. 1971.
- Jens, Walter: Kindlers neues Literaturlexikon, Bd. 2., München 2001,
- Ziegler, Leopold: Apollons letzte Epiphanie. Leipzig 1937.

'23 철학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설호: "인간은 막힘없이 피어나는 우주의 꽃이다." 윤노빈의 신생철학 (0) | 2025.06.02 |
|---|---|
| 서로박: (5) 플라톤의 국가 (0) | 2024.09.05 |
| 서로박: (4) 플라톤의 국가 (0) | 2024.09.05 |
| 서로박: (3) 플라톤의 국가 (0) | 2024.09.05 |
| 서로박: (2) 플라톤의 국가 (0) | 2024.09.05 |